-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120년 전 서른두 살 박승직이 배오개, 지금 종로 4가에 포목 도매점을 열었다. 10년 넘게 보부상 해 모은 돈으로 차린 가게였다. 장사가 번창해 그를 ‘배오개의 거상’이라 불렀다. 그는 이런 신망을 밑천 삼아 1905년 한성상업회의소를 세웠다. 손자 박용만이 회장인 대한상공회의소 전신이다. 1936년 아들 박두병이 가업을 이었다.
경성고등상업학교를 나와 은행에 다녔던 그는 경영에 밝았다. 일본인 기업 소화기린맥주를 광복 후 사들여 키운 것이 OB맥주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두산은 여느 재벌과 내력이 다르지 않다. 별난 것은 승계와 경영 방식이다. 인화와 신뢰를 중시한 선대의 뜻에 따라 형제가 3~4년씩 돌아가며 총수를 맡는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가족 모두의 의견을 모은다. 가족 공동체 경영이다. 오너 일가가 그룹 지주회사 두산의 지분을 40% 넘게 가졌지만 고루 지분을 나눠 누구도 전권을 휘두를 수 없다.
브한 공동 경영으로 장수하는 기업은 세계에서도 드물다. 스웨덴 출판 기업 본니에르(212년), 프랑스 명품 업체 에르메스(170년), 오스트리아 악세서리 회사 스와르프스키(119년) 쯤이다. 그래도 두산처럼 영제가 돌아가며 총수를 맡진 않는다. 두산은 2·3세끼리 볼쌍사납게 다루는 다른 재벌들과 곧잘 비교된다. 그런 두산 가족도 11년 전 경영권 다툼을 벌인 일이 있다.
박용모 전 회장이 동생 박용성 회장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투서를 넣는 바람에 오너 일가의 비자금 500여억원이 들통났다. 두산가 형제들은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 감옥살이는 면했다. 박 전 회장은 재기를 노리다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두산그룹 총수가 창업 4대째, 창업주의 증손자 박정원씨로 바뀌었다. 재벌 기업이 4대까지 이어진 건 처음이다.
아시아의 거대 기업 중에 4세 경영을 하는 곳은 일본 도요타쯤이다. 두산 일가는 앞으로도 형제 경영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한다. 두산그룹을 2000년 이후 한국중공업과 함께 밥캣을 사들이고 맥주 사업을 정리해 변신을 꾀했다. 그러나 10년 넘게 고전하며 지난해 1조 7000억원 적자를 냈다. 얼마 전 입사 1~2년 된 신입 직원들까지 해고하려다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기업을 누가, 어떻게 경영할지는 대주주 오너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대신 잘못된 경영으로 회사가 망가지면 그 피해는 주주와 거래처, 종업원들은 물론 고객들에게까지 미친다. 새 총수에게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 차기 회장으로 일찌감치 예정돼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룹을 이끌게 된 박정원 회장이 이런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30년 넘게 여러 계열사에서 경영수업을 쌓았다고 하지만 외부로부터 경영능력을 평가받는 기회는 없었다. 과거 실적으로 따져본다면 경영능력에 의문이 든다. 1994년 OB맥주 상무에 취임했던 박 회장은 당시 조선맥주(옛 하이트맥주)에 업계 선두자리를 내줬고, 결국 외국계가 매각했다. 2009년부터 두산건설 대표이사회장인데, 이 회사는 지난해 ㄷ아기순 손실 5207억원을 기록하는 등 2011년 이후 5년 연속 적자에 빠졌다.
박 회장은 2013ㄴ년부터 미등기 이사이다. 박 회장은 싱가포르 영주권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고, 둘째 아들은 싱가포르 영주권자 자격으로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재별가 가족이 내부에서 후계자를 정해 경영권을 주고받은 것은 무책임하다.
물론 능력이 있는 인물이라면 경영 세습을 막을 명분이 없다. 하지만 재별가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추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재별 총수 일가의 의사결정에 대해 기관투자가나 사외이사 등이 견제하고, 향후 그 열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두산그룹에 대한 재계의 기대가 높지만 환호하기엔 이르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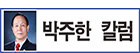




![[칼럼]젊은 20대 세대들의 젠더 갈등 문제해결 방안 시급 [칼럼]젊은 20대 세대들의 젠더 갈등 문제해결 방안 시급](http://newssunday.co.kr/data/file/news/thumb/thumb-237648330_03iU1Ddp_d436bf3c7397e9fd0d939b5c20a357667a7ab3dc_166x120.jpg)

